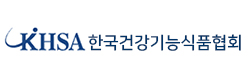"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재설계 필요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간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간병비 절감 정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가 현실화와 인력 기준 개선 없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과 의료·노동·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는 분명하지만…참여 병상은 여전히 제한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보호자 부담 완화라는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낮은 수가와 인력 운영 부담이 제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발제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효과는 분명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까지 겹치며 지속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획일적 인력 기준 한계…중증도 기반 전환 필요
인력 배치 기준의 경직성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의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환자의 다양한 간호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인력 배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엇보다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 인프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고,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 있는 인력·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통합돌봄 앞두고 ‘질적 전환’ 필요성 부각
제도 개편의 시급성은 향후 정책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시행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논의였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 역시 국가 책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