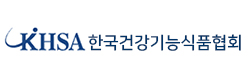“식욕만 참으면 살 빠질까? 몸은 오히려 ‘저장 모드’로 변한다”

최근 ‘식욕 억제’를 중심으로 한 급속 감량법이 SNS와 다이어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식욕을 줄여 식사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방식은 단기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몸의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흔들어 오히려 체중 회복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비만센터 이재동 교수는 “식욕 억제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빠르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곧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생존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대사량이 내려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욕 억제제를 중단하면 신체는 약물로 억눌렸던 ‘배고픔 신호’를 보상적으로 증가시키며 강한 식욕을 유발한다. 이 교수는 “약물 중단 후 평균 1년 안에 감량한 체중의 대부분이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요요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왜 살이 찌는가’가 핵심
전문가들은 식욕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호르몬 회로가 정교하게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능이라고 강조한다.
이 회로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몸은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 섭취 에너지를 더 강하게 끌어들이고 지방을 비축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즉 체중 조절의 본질은 식욕 억제가 아니라, 몸이 왜 체중을 유지·증가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피로, 무기력, 근육 감소, 대사 저하 등이 반복되며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빼기’가 아니라 ‘돌려놓기’”
이 교수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을 ‘에너지 흐름의 장애’로 본다고 설명한다.
“지방을 억지로 빼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체중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몸의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적게 먹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에너지 기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 ① 에너지 생성 기능(비위) 저하형 -손발이 차고 식후 졸림이 심함 -소화 기능이 약해 조금만 먹어도 피로 -따뜻한 음식·소량 빈식이 적합 ▲ ② 에너지 순환 기능(심폐) 장애형 -물만 마셔도 잘 붓고 몸이 무거움 -대사 순환이 느려 체중 정체가 심함 -가벼운 유산소 운동·야식 금지가 관건 ▲ ③ 에너지 균형 기능(간·신) 장애형 -상체 열감·야식 욕구·감정적 폭식이 흔함 -저녁 격렬 운동은 오히려 열감을 증가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이 효과적 |
이 교수는 “체질별 에너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다이어트 방식이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욕은 억제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몸의 신호”
이재동 교수는 식욕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접근이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식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피로·호르몬 변화·정서 스트레스·수면 부족을 반영하는 몸의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강제로 꺼버리면 몸은 언젠가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이어 그는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에너지 흐름을 조절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