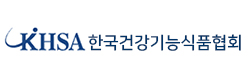비대면 세상이 만든 신종 증상 '콜 포비아'
일명 '전화 공포증'으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뛰어
할 말을 적어 놓지만, 예상 밖의 대화가 될까봐 두려워
업무전화 피하는 MZ사원..상사의 스트레스 증가

이렇게 하나씩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은 통화 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점차 그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텍스트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 전화처럼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수다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한 심각한 내용의 경우 즉각 답신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답신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중에도 컴퓨터로 연결되어 언제든 어렵지 않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한 텍스트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전화를 받아서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다.
일종의 '콜 포비아' 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전화공포증이라고 불리는 '콜 포비아'는 아직 정식으로 통용되는 병명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많은 겪는 문제적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는 젊은 층에서 생기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에서 거래처와 전화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이러한 젊은 사원 때문에 덩달아 상사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까지 젊은 사원의 거래처 전화를 본인이 대신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지난 4월 초, 가수 아이유는 공식 유튜브 채널 코너인 ‘아이유 팔레트’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했다. 아이유는 ‘아무하고도 통화를 못 한다’,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오면 조금 불편해진다’라고 말했다. 오로지 불편하지 않은 대상은 매일 얼굴을 보는 매니저에게 전화가 올 때 라고 했다. 이러한 아이유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직장인 김 모(24)씨는 “전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아니면 대부분 통화는 급히 용건만 전하고 끊는다”며 “회사 업무로 거래처와 통화를 하게 되면 미리 말을 준비하고, 상대가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른 내 대답도 미리 적어 놓는다. 그러나 예상에 빗나가는 말을 상대가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말실수 할까봐 두려워서 전화 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벨이 울리면 우선 가슴부터 철렁 한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라면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직장 상사나 거래처 인맥이라면 손에서 땀이 나기까지 한다고 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평가한 결과, 문자, 메신저, SNS 등 텍스트 위주의 소통(51.9%)이 가장 많고, 직접 대면 소통(28.8%), 통화, 보이스톡 등 전화 소통(1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 속 ‘전화 통화’ 경험 관련 인식 조사에서는 아직은 많은 사람이 전화 통화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텍스트 위주의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통화 부담(20대 42.0%, 30대 32.4%, 40대 26.0%, 50대 16.8%)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콜 포비아’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콜 포비아(Call phobia)는 현상은 단순히 통화하는 행위를 넘어서 전화를 어려워하고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걸 때 불안, 공포, 불쾌감 등을 느끼는 경우를 가리킨다. 콜 포비아 현상의 증상으로는 전화 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고 긴장을 한다거나, 통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끊으려고 하고,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몸이 떨리거나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한다.
또 전화할 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증상을 보인다. 전화를 걸 때 신호음이 가면 상대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콜포비아의 증상이 심하면 전화 통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끊은 후에도 긴 시간 동안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콜 포비아라는 개념은 1994년 존 마셜의 저서 ‘소셜 포비아’에서 처음 유래했다. 이 개념의 등장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버튼만 누르면 쉽게 직접적인 대화 없이 SNS로 연락과 배달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이 현저히 줄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전화를 기피하는 콜 포비아 현상이 다시금 떠오르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낯선 상대와 대화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불편(60.1%, 중복응답)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데다(37.2%) 평소 통화 자체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 부담스럽다(33.4%)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20대 응답자일수록 모르는 상대와 통화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20대 35.2%, 30대 30.9%, 40대 29.2%, 50대 19.0%)과 텍스트 위주의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20대 40.0%, 30대 33.3%, 40대 15.4%, 50대 14.3%)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것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하루종일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상생활, 업무가 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음식주문이나 쇼핑, 다른 여러 예약까지도 앱을 통해 터치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환경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 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다.
요즘은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까지 '전화 스피치' 강의가 생기는가 하면, 일부 대기업은 전화 응대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콜 포비아' 증상 극복을 도와주는 전문 업체의 상답료는 시간당 6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는 이제 끝이 났다. 마크스 뒤로 얼굴의 반을 숨기거나, 비대면을 무기 삼아 문자나 카톡만으로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비대면에 익숙한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고 모든 소통의 기본은 대화이다.
전문가들은 콜포비아도 노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가장 편한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수다를 나누는 등 짧은 통화를 시도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콜 포비아 증상이 있다면 전화를 피하기보다는 반복적인 통화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증상이 신체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