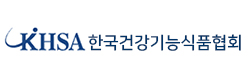[한의학 집중조명14] 더 나은 한의학을 위한 열정(1)
한의학에 어떤 '비기'가 있다고 믿어
병이 나면 '명의'를 찾아 기다리는 현상의 대안이 필요한 때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사람'고치는 의학 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상'에 집중하여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생각하고 생활습관과 환경에 더 집중한 의학입니다.
한의학은 특별하거나 생소하거나 예스러운 의학이 아닙니다. 매우 현대적인 개념의 '예방의학'에 주력한 의학입니다. 아프고 난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방의학은 더욱이 개개인의 체질에 맞춰 개별 처방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발전을 인정받아 '한의학'을 영어사전에 검색하면 'Korean medicine' 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 더욱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본 치료' 라는 뜻의 'MOBON(모본)' 입니다. MOBON에는 같은 뜻을 가진 한의사들이 모여, 자신들의 임상연구를 공유하고, 현대사회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아프기 전에 쉽고 가깝게 한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 MOBON은 '한의학'이 더욱 사람들의 삶속으로 밀접하게 들어가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K-medicine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MOBON'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더 나은 한의학을 위한 열정
떡볶이의 맛은 고추장에 있다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로 유명한 한 할머니는 절대로 그 고추장 맛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그 가업을 이어야 하는 며느리도 모른다고 했었다. 실제로 맛있다고 잘 알려진 식당들의 경우, 그 음식의 레시피는 비밀이다. 어느정도 까지는 알려주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수준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중국 음식의 대가인 Lee씨는 모든 레시피를 알려준다. 누구든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알려준단다. 그렇게 가게의 영업 비밀을 알려줘도 되는 거냐고, 그러다 가게 망하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한다. 자기가 아무리 똑같이 알려주어도 사람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이 다르고, 손맛이 달라서 다른 맛이 난다고.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의학이라고 하면, 치료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영업비밀’이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희망이나, 수단처럼 찾아간 한의원에서 그동안 왜 돌아다녔는지 무색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고질이었던 병이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월한 치료를 경험하면, 한의원은 고질병을 고치는 곳이 되고, 나아가 난치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난다. 이른바 명의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한방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효험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한의원에 가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사람들의 인식이 알음알음 변했기 때문이다. 기회가 닿으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담이라도 걸린 어느 날, 드디어 한의원을 찾는다. 신뢰가 가는 한약 달이는 은은한 냄새를 맡으며 한껏 기대를 한다. 진료를 받고 돌아와 하루하루 약을 먹는다. 그러나 생각만큼 빨리 담이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어찌 효과가 없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생각한다. 아. 역시. ‘용’한 한의원이 있는 것인가. 누구는 어디어디서 빨리 나았다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을 보니 그런가보다고. 역시 ‘비기’는 따로 있는 것이라 믿는다.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은 우리들의 ‘명의’

사람들은 병이 나면 당연히 병원을 찾는다. 흔한 병이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간다. 이사를 가지 않고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살면 자주 가는 병원이 생기고, 가족이 다 그 병원을 다니게 된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는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된다. 그런데,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병원을 간다. 또, 휴일에 아플 때에는 동네 병원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날 문을 연 병원을 간다. 왜 그럴까. 어디에 가도 같은 병이라면 비슷한 성분의 약을 주고, 비슷한 효과를 내서 비슷한 시기에 낫기 때문이다.
흔한 병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 동네의 큰 병원을 갈까? 대부분은 이름난 큰 병원을 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알려진 큰 병원. 첨단 장비가 있다는 병원. 요즘처럼 소멸이 임박했다고 운운하고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이웃의 큰 도시로 병원을 찾아 간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리 바꾸기를 하듯 더 큰 도시로 병원 유목을 떠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를 떠나 조금 더 큰 도시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그 분야에서 알려진 의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무턱대고 찾아 갈 일이 아니다. 예약이라는 첫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예약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직감한다. ‘아 내가 정말 유명한 의사를 찾아왔구나.’ 왜냐하면 진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약에서 살아남았는데,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병원의 평균 진료는 2분 정도라고 한다.
(9월 14일 목요일에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